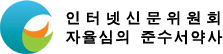054. 천손(天孫)은 어느 곳에 노니는가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문헌서원(文獻書院)>을 찾아서 ①
마침내 문헌서원 주차장에 이른다. 햇살이 고울 대로 고와서 작은 티끌 하나 생각 하나 자칫 땅에 떨어뜨릴까 삼가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관리사무소 곁을 지나 가을나무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걷는다. 햇살이 고와 그림자의 모습이 확실하다.
그림자를 밟는다는 것이 어쩌면 내 자신의 그림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함부로 헛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를 밟는 일이 결코 헤픈 몸짓이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그러하거니와 자연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바로 눈앞에 앉아 계신 목은 이색 선생의 상(像)이 나타난다.
그런데 목은 선생의 상이 하얀 옥돌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상과는 전혀 다른 재질로 세워진 목은 선생의 상은 숭고한 정신이 저절로 일게 한다. 고려의 충신으로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고상하고 깨끗한 정신으로부터 존엄하고 거룩한 기품이 엿보이게 하는 목은 선생의 상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올곧고 완전무결(完全無缺)한 정신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해가 창문에 매달리듯 기웃거리기 시작하자 어두웠던 창문이 훤해진다.
벌써 08시 30여 분이나 지나있다. 오늘 새벽녘에 이르러서야 잠을 마중하려 했다가 결국 늦잠자기에 이른 것이다. 창문을 가린 바인더를 올리고 창문을 열어젖히자, 눈부신 햇살이 방안으로 떼 지어 들어온다. 두 눈이 부시다. 이미 가을에 든 기운이 방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따뜻함을 느낀다.
훈훈하여 좋다. 밤을 새워 어둠을 만나 세상의 길을 걷던 복잡한 가슴이 순간적으로 포근해진다. 아, 아침의 훈훈함이여!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란다. 오늘 오전 중에 <문헌서원>을 찾으려 마음 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시간은 늦잠에서 깨어난 나에게 아침식사를 재촉하며 달궈대고, 창밖의 뜨락에는 감나무가 짙은 그림자를 내려놓고 있다. 서둘러 산애재(蒜艾齋)의 대문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느덧 시간은 충절로에 이르게 하고, 문헌서원(文獻書院)을 안내하는 이정표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한다. 문헌서원이 있는 영모리(永慕里) 마을은 조선시대 한산군 서하면(西下面)의 지역으로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영모암이 있으므로 영모암 또는 영모라 부르던 지역이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영모리가 되었고, 한산이씨(韓山李氏)들이 많이 살며 그 집성 마을도 있다 한다.
또 다른 안내문에는 <한산팔경 제1경 숭정암송(崇井巖松)>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놓고 있다. 그 위에는 목은 선생의 <목은선생독서산사휴허비(牧隱先生讀書山寺遺墟碑)>가 보인다.
가정 이곡(1298~1351)과 목은 이색(1328~1396) 부자가 원나라의 과거시험에 합격하자 중국과 고려에서 고향 한산(韓山)이 유명해졌다.
이에 목은 이색 선생이 한산을 중국과 고려에 알리고자 고향의 아름다운 경관 여덟 곳을 선정하여 읊은 시(詩)가 <한산팔경(韓山八景>이다. 한상팔경은 숭정암송(崇井巖松), 일광석벽(日光石壁), 고석심동(孤石深洞), 화사고봉(回寺高峯), 원산수고(圓山戍鼓), 진포귀범(鎭浦歸帆), 압야권농(鴨野勸農), 웅진관작(熊津觀釣) 등이다.

제1경 숭정암송(崇井巖松)
봉두창석용(峰頭蒼石聳) : 봉우리 위엔 푸른 돌 돋아났고
송정백운헌(松頂百雲連) : 소나무 이마 언저리엔 흰 구름 연하였네
나한당요격(羅漢堂寥闃) : 나한당 적적도 한데
거승잡교선(居僧雜敎禪) : 거주하는 중들은 교와 선이 섞였네
이에 푸른 서천21에서는 한산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한 고려 3인중의 한 분인 목은 이색 선생의 한산팔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1경 <숭정암송(崇井巖松)>부터 안내문을 설치하고 홍보하기로 하였다.
2014. 10. 15.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
문헌서원에 들어가는 길가에는 논밭의 농토가 제법 넓고 길은 잘 닦여져 있다. 그러나 문헌서원은 골 깊숙이 감추어져 있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입구는 낮고 올라 갈수록 조금씩 높은 곳을 볼 때, 전형적인 배산임수가 잘 되어 있는 고을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영모리에 들어서면 기린봉이 보이는데, 산의 형태는 구릉 진 전형적인 마을의 모습을 보여준다. 안내문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문헌서원이 점점 가까워진다. 충절로로부터 길 좌우에 회화나무의 푸른 잎들이 이제는 서서히 가을로 물들어 가고 있다.
아, 이제는 가을. 그리도 무덥던 여름은 지나가고 들녘이나 산비탈에서 제각각 누렸던 나무들이 초록의 생을 거두기 시작한다. 어떤 회화나무에서는 벌써부터 누런 잎을 한 둘씩 떨어뜨리곤 한다. 문헌서원에 이르는 봄철, 좌우에는 회화나무 밑으로 붉은 매화꽃으로 물들어 놓아 얼마나 장관이었던가.
그러나 이제는 가을, 가을로 접어들면서 도로가 논에서 일제히 익어가던 벼들이 공손히 몸을 굽히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회화나무들이 일제히 초록 짙은 오만의 여름에서 벗어나고 있다.

원래 이 회화나무는 다른 이름으로 ‘학자수(學者樹)’로도 불린다. 영어 이름도 같은 의미인 ‘스칼러 트리(scholar tree)’다. 나무의 가지 뻗은 모양이 멋대로 자라 ‘학자의 기개를 상징한다’라는 풀이도 하고 있다. 또한 아무 곳이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가지를 뻗어대는 곡학아세(曲學阿世)를 대표하는 나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옛 선비들이 이사를 가면 마을 입구에 먼저 회화나무를 심어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비가 사는 곳’ 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곤 하였으며, 더불어 뒷산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쉬나무’를 심어 불을 밝히고 글을 읽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한다.
이렇게 회화나무는 여러 이유로 궁궐은 물론 서원, 문묘, 이름난 양반 마을의 지킴이 나무로 흔히 만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헌서원으로 가는 길가 가로수로 회화나무를 심은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문헌서원이 어떠한 곳인가를 나무를 통하여 옛 선비들의 높은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특히 중국이 고향인 회화나무는 상서로운 나무로 생각하여 중국인들도 매우 귀하게 여겨왔으며, 회화나무를 문 앞에 심어두면 잡귀신의 접근을 막아 그 집안이 내내 평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회화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문헌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은 영모리를 소개하는 안내표석과 함께 ‘영모리마을 만들기 사업계획도’, 그리고 바로 그 곁에 새워진 목은 이색 선생의 시비(詩碑)이다. 검은 오석(烏石)에 매화그림이 새겨져 있고, 곁으로 목은 이색 선생의 시조 한 수가 담겨 있다.

白雪이 ᄌᆞ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梅花ᄂᆞᆫ 어곳에 픠엿ᄂᆞᆫ고
夕陽에 홀로 셔이셔 갈 곳 몰라 ᄒᆞ노라
- 牧隱先生의 時調
고려왕조 마지막인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심정을 자연의 경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식인의 고뇌를 ‘夕陽에 홀로 셔이셔 갈 곳 몰라 ᄒᆞ노라’하는 탄식 속에 묻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디선가 나타나줄 것만 같은 ‘매화’와 연결시켜 그 심정을 더욱더 애달프게 한다. 기울어 가는 고려 왕조를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지은이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정도전 일파와 함께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고려의 국운은 석양의 백설처럼 잦아지고 있는데 험악한 무리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인재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고려의 망국(亡國)을 지켜만 보는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개탄하는 목은 선생의 애국지심(愛國之心)이 절절히 배인 시조이다.
목은 선생은 이성계와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1389년 이성계 일파가 고려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즉위시키자, 목은 선생은 이를 규탄한다. 그러다가 장단, 함창, 청주, 한주, 금주 등으로 유배당하고 만다. 장자인 종덕은 역살 당하고, 나머지 아들들도 유배되는 비운을 맞는다.
한편으로는 문생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도 등을 돌렸고, 정도전은 목은 선생의 탄핵에 앞장서기까지 한다. 세상은 모두 목은 선생을 떠났고 해는 서산에 기울고 어둠의 시계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 ‘白雪이 ᄌᆞ자진 골에’는 이때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거니와 고려의 왕조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으니, 목은 선생은 그저 외로운 매화 한 송이일 뿐이다. 1392년 조선이 건국하자 목은 선생은 붓을 꺾고 만다.
고려의 운명처럼 목은 선생은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이르러 오래 견디지 못할듯하면서도 눈 속에서도 피어난 고상하고 깨끗한 매화처럼 존엄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시작품만도 6000여수에 달했던 당대 제일 가는 문장가이었거니와 목은 선생에게 있어서 시는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으며 끝이었던 바,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시로 강론하였고, 정사(政事)를 말할 때에도 시로 행했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은 선생이 붓도 던지고 시도 던졌으니 조선의 건국은 죽음과도 같은 셈이다. 이름조차 쓰지 않겠다는 참담한 심정이 어떠한가를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을 하리오, 한 때 같이 죽지 못하였음이 한이었고, 이 몸도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만 백이ㆍ숙제와 같이 수양산에서 고사리나 캐먹고 싶으나 그것도 무슨 심정으로 주나라(조선) 곡식을 먹으리오. 나머지 다 쓰지 못하고 망국이 죄인이니 아름을 쓰지 않겠오. - 『목은 선생연보』 65세조
마침내 문헌서원 주차장에 이른다. 햇살이 고울 대로 고와서 작은 티끌 하나 생각 하나 자칫 땅에 떨어뜨릴까 삼가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관리사무소 곁을 지나 가을나무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걷는다. 햇살이 고와 그림자의 모습이 확실하다.
그림자를 밟는다는 것이 어쩌면 내 자신의 그림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함부로 헛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를 밟는 일이 결코 헤픈 몸짓이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그러하거니와 자연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바로 눈앞에 앉아 계신 목은 이색 선생의 상(像)이 나타난다.
그런데 목은 선생의 상이 하얀 옥돌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상과는 전혀 다른 재질로 세워진 목은 선생의 상은 숭고한 정신이 저절로 일게 한다. 고려의 충신으로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고상하고 깨끗한 정신으로부터 존엄하고 거룩한 기품이 엿보이게 하는 목은 선생의 상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올곧고 완전무결(完全無缺)한 정신을 일깨워주는 듯하다.

왼쪽으로 살짝 비껴 몇 발자국을 걸으니 홍살문[紅箭門] 앞에 이른다. 홍살문은 능(陵) · 원(院) · 묘(墓) · 궁전(宮殿) 또는 관아(官衙) 따위의 정면에 세우는 붉은 칠을 한 나무 문(門)으로 홍전문(紅箭門) 또는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둥근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위에는 지붕이 없이 화살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워 놓았고, 그 중간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
이 홍살문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는 문헌상 기록이 없어 확실히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다만 세워진 장소로 보아서는 경의(敬意)를 표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홍살문 바로 앞에는 하마비(下馬碑)가 다소곳이 서 있다. 하마비는 ‘大小人員皆下馬(대소인원개하마)’라고 새긴 글을 줄여 이르는 말로, 궁가(宮家) · 종묘(宗廟) · 문묘(文廟) 등의 앞에 새겨 세워진다. 누구든 이 앞을 지날 때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의미이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경계(警戒)하면서 홍살문 안에 들자 입구 좌측으로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 7개의 비석으로 이루어진 고려 충신의 위패이기도 하다.

7개의 비석들의 숲을 이루고 있다하여 ‘비림(碑林)’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오른쪽으로는 연못과 경현루(景顯樓)가 한가로운 모습을 하고 가을 속에 젖어있다. ‘경치가 나타나는 다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아무래도 경치보다는 목은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헌서원인 만큼 연못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득 목은 선생이 부벽루(浮碧樓)에 올라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고사를 회고한 작품으로, 시간과 공간의 조화 있는 묘사를 통하여 수준 높은 한시의 세계를 과시한 절창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선생의 시 한 편을 떠올린다.
昨過永明寺(작과영명사) : 지난 번 영명사를 지날 때
暫登浮碧樓(잠등부벽루) :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城空月一片(성공월일편) : 텅 빈 성에 한 조각달이 걸려 있고
石老雲千秋(석로운천추) : 해묵은 돌은 천년세월에 늙어 있네
麟馬去不返(인마거불반) :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天孫何處遊(천손하처유) : 천손은 어느 곳에 노니는가
長嘯倚風磴(장소의풍등) : 길게 휘파람 불며 돌계단에 기대니
山靑江自流(산청강자류) :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경현루景顯樓에 올라
구재기
맑은 숨소리를
들어 보기로 한다
계절이 지나고
어제 불던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있는데
바람 지난 자리에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의 숨소리일까
먼 곳 배롱나무 우듬지에서는
실오라기 같은 연기 하나 없이
시뻘건 꽃불이 잇대어 타오르고
사우(祠宇)를 지나던 구름 한 조각
제 그림자에 흠칫 놀라
서둘러 거둬들이고 있는데
세상사 가진 것들은 절로 쉽게
말[馬]을 빌려 타듯 살아가고 있구나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일여(一如)한 경계(經界)가
분명히 있고 보면
텅 비어 있는 세상
고매(高邁)한 숨소리는 크게 울린다
*경현루(景顯樓) : 충남 서천 문헌서원의 연못가에 세워진 누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