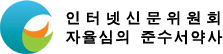012. 비인면 선도리 당산을 찾아서 - 충남 서천군 비인면 갯벌체험로572번길 18-2 (선도리 399)
저 당산바위의 소나무 세 그루는 부부로서 혹은 외동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부부로서, 외동이는 외동이로서 삶의 방향을 바로 하여 전범이 되는 가족의 모랄(Moral : 인생이나 사회에 대한 정신적 태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간밤에 인터넷을 통하여 ‘당산의 일몰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읽고 난 뒤에 다시 가고 찾고 싶은 곳은 다름 아닌 ‘선도리 당산’이다. 그러나 당산의 일몰이 아름답다 하여 일몰을 보고자 찾는 것은 아니다. 그냥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일 뿐이다.
당산을 처음 찾았을 때는 9월 19일 역시 같은 목요일이었으니 이미 한 달도 더 된다. 그때의 그 가슴 벅찬 느낌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었고, 다시 찾아가는 것 또한 처음 찾았을 때의 그 느낌 그대로 되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이다. 아무튼 서천읍을 빠져나와 군도 5호선을 타고 해안으로 달린다.
배롱나무가 점점 가을을 한껏 모아 가는지 하나 둘 낙엽으로 날리는 품이 조금은 안타깝게 한다. 가을이 가지는 의미는 풍요와 조락(凋落)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락의 의미라 하겠다. 점점 빈 가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2009년 건설교통부 선정 ‘아름다운 도로 100선’으로 선정되지 않았던가? 그만큼 아름다운 도로이다. 그러하거니와 가을이 주는 이러한 슬픔 의미조차도 아름다움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름다운 조락, 이것 또한 군도 5호선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놓은 듯하다.
그러고 보니, 2011년 국토해양부 선정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중 ‘낙조 감상하기 좋은 해안길’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도 다시 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리구불저리구불 천천히 도로를 달리면서도 시선은 자못 해안을 따라 함께 한다. 멀리 보이는 바다가 몹시 현란하다. 한창인 오후의 햇살을 마음껏 들이마신 탓인지 모르겠다. 차창 유리를 틈입하여 들어오는 햇살보다도 한층 더 눈부신 햇살이 바다물결과 함께 출렁이면서 더욱 눈부시게 다가온다. 아마도 푸르디푸른 바닷물에 가뜩이나 부풀어 오른 까닭이리라.

문득 내리막길을 스르르 미끄러진다 싶더니 목적지의 안내판이 앞을 가로막는다. 당산바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선도리 3구라 말해준다. 그러나 당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승용차도 비낄 수 없는 좁은 도로다. 잘 닦여진 포도鋪道였으나 자칫 진입했다가는 서로 비껴나기도 힘들 정도여서 자못 염려되기도 한다.
어쩐지 맞부딪칠 승용차를 만날 것 같다는 예감이었는데, 그야말로 그대로 딱 들어맞는다. 앞에서 차가 오고 있다. 그런데 앞차는 계속 나오지 않고 일순 중간에 멈춘다. 그러고 보니 그곳이 바로 서로 비껴나갈 공간이다. 마을사람의 승용차임이 분명하다. 기다려주는 마음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아마도 이곳 주민들은 저 너른 바다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있는지 모른다 싶기도 하다.
승용차를 비껴 조금 더 몇 미터 진입해 들어가자, 아, 바다는 크게 숨을 쉬고 있다. 가슴이 탁 트인다. 처음 왔을 때에 느끼지 못하였던 바다의 거친 숨소리, 얼마나 먼 길을 단숨으로 달려왔기에 저리도 가쁜 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당산바위는 밀물 때를 맞아 바다의 숨소리를 고스란히 모으고 있다. 조용한 모습이다. 아니 정중하고도 근엄한 모습이다. 밀물이 아무리 성난 소리를 거듭하여 빚어내어도 결코 작은 흔들림 하나 보이지 않는다. 흙이라고는 단 한 줌 없는(?) 순전한 바위로 버티고 서 있는 당산바위다.
오직 바위틈 사이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나무 세 그루가 바닷바람에 더욱 짙푸른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엄습하여 내달리듯 들려오는 물결소리가 높아질수록 소나무 세 그루의 흔들림 없는 몸짓은 거대한 바다를 포근하게 다독여준다.
이 당산바위의 소나무 세 그루는 ‘부부송’과 그 부부의 ‘외동이’이란다. 그러고 보니 두 그루는 조금은 늙고 쇠잔하여 마른 몸을 하고 있으면서도 몸을 조금 굽힌 채로 밀물을 맞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그루는 건장한 청년쯤이라도 되는지 우람한 모습으로 온 바위를 휘감을 듯한 기세를 터뜨리면서 들어오는 밀물을 홀로 굽어보고 있다.

당산의 소나무가 ‘부부나무’라면 분명 서로 가까이하고 있는 두 그루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을 한곳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부부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까지도 함께한다. 그러나 또 다른 소나무는 외동이처럼 홀로 서 있다.
한창 젊은 나이에 들어서인지 힘이 넘쳐흐르며, 굵직한 몸통에 모든 가지를 사방팔방으로 자신 있게 뻗어 보이는 모습이 우람하고 당당하다. 당산바위에서 소나무 세 그루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누군가 쓸쓸히 서 있는 바위라 하였지만, 당산바위는 비록 천년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마디 허투로 말 한 적이 없는 침묵을 여전히 지켜오고 있다.
한 기족을 이루는 부부송夫婦松의 실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부부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릇 한 가족이 또 한 가족에게 근본적으로 줄 수 있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불행은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불만이라는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의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저 당산바위의 소나무 세 그루는 부부로서 혹은 외동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제공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부부로서, 외동이는 외동이로서 삶의 방향을 바로 하여 전범이 되는 가족의 모랄(Moral : 인생이나 사회에 대한 정신적 태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부나무에서 시선을 돌려 먼 바다를 본다. 부부나무가 공손한 허리를 굽혀 바라보는 시선을 멈춘 곳에는 할미바위가 자리하고 있다. 밀물이 점점 거세게 밀려올수록 할미바위를 옹위하듯 얼싸안는 물결이 흰 포말을 치솟아 올리곤 한다.
언뜻 그 모습은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잠수를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물을 내뿜는 듯하다. 어쩌면 할미바위의 가슴속에 가득한 부부송에 대한 그리움의 열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밀물과 맞닿아 한 마리의 고래가 되어 물을 내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니라 부부송과 몇 발자국 거리로 떨어져 있는 외동이 소나무 한 그루는 너른 바다를 건너 형제섬을 향하여 굵고 힘찬 가지를 흔들어대고 있다.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바라보며 홀로 선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으려니 당산바위의 부부송과 외동이 소나무, 그리고 할미바위와 형제섬 사이가 그 이름만으로도 끈끈한 혈연을 맺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지 않은 바다의 물결을 사이에 두고 할미바위와 형제섬, 그리고 당산바위 위의 세 그루 소나무가 마주하여 이웃으로 자리하고 있을 까닭이 전혀 없다.
할미바위와 당산바위와 형제섬을 번갈라 바라보다가 몇 발걸음을 옮겨 우우우우 우렁찬 소리로 몰려오는 밀물 앞에 선다. 밀물의 몸놀림에는 거침이 없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결의 높이는 더하고, 그 외침은 점점 격앙되어온다.
그때마다 하얀 포말이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곤 한다. 부드럽게 떨다가 움직거리며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거침없이 밀려왔다가 사르르르 미끄러지듯, 그렇게 바닷물에 몸을 담그듯 밀려가는 물결을 뒤따른다. 그러면서 발자국을 새겨놓는다.
그러나 다시 밀려오는 물결에 발자국은 소리 소문도 사라진다. 소리치며 몰려드는 물결에 그만 발목을 적시고 만다. 발목을 물결 속에서 슬그머니 빼놓는다. 그리고 당산바위의 너설 위에 몸을 앉힌다. 밀물져오는 바다를 바라본다.
아득한 수평선으로부터 밀물은 시종 일관된 몸놀림을 보여준다. 쏟아져 내리는 가을 한낮의 진한 햇살을 송두리째 연하여 끌어안는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짐짓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밝고 맑고 환한 시공時空을 향하여 밀물은 지금 치달려오고 있다.

중간에 단 하나 걸리거나 막히는 일이 없는, 이 거침없는 밀물, 이 밀물과 함께 하려 소망하려 해도 완전히 들어주기는커녕 그래도 조금은 소망으로 여길 만한 어떤 변화나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않을 듯싶다.
그렇다. 이 밀물과 함께 영원히 마음 할 수는 없다. 당산바위 너설로부터 밀물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슬며시 몸을 일으킨다. 그러나 밀물은 언제 알아차렸는지 막무가내로 발목을 잡는다. 흠뻑 젖어든다.
이제부터는 더 가까이하지도 더 멀리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영원히 마음 하는 거리를 하며 당산바위를 다시 찾기로 한다.
신부의 가슴처럼 부드럽게 떨면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정다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느릿느릿 물결치고 있는 당산바위는 지금 밀물과 함께 이쪽저쪽 하늘 높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모른다.
따를 수 없는 영원한 거리만큼 가까이 하기로 한다.

당산바위 송頌
구재기
지워야 할 것을
가까이하여 지울 수 있을까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하여
끝 간 데 없이
확실하게 이어진 바다
이곳에서는
무미無味한 사랑도
분명한 사랑이 되었다
맑고 부드러운
신부의 젖가슴처럼
아물아물 일렁이는 물결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사알짝 돋아나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두근두근 가슴 하나로
열려오는 바다, 그 신부처럼
아스라한 길이 슬그머니 열렸다
언제보아도
잊혀 지지 않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지울 수가 없다
줄기줄기 굽이쳐 오는 물결
아, 이곳에서는 이미
씻겨 없어져버린 추억도
진하게 살아나는 사랑이 되었다